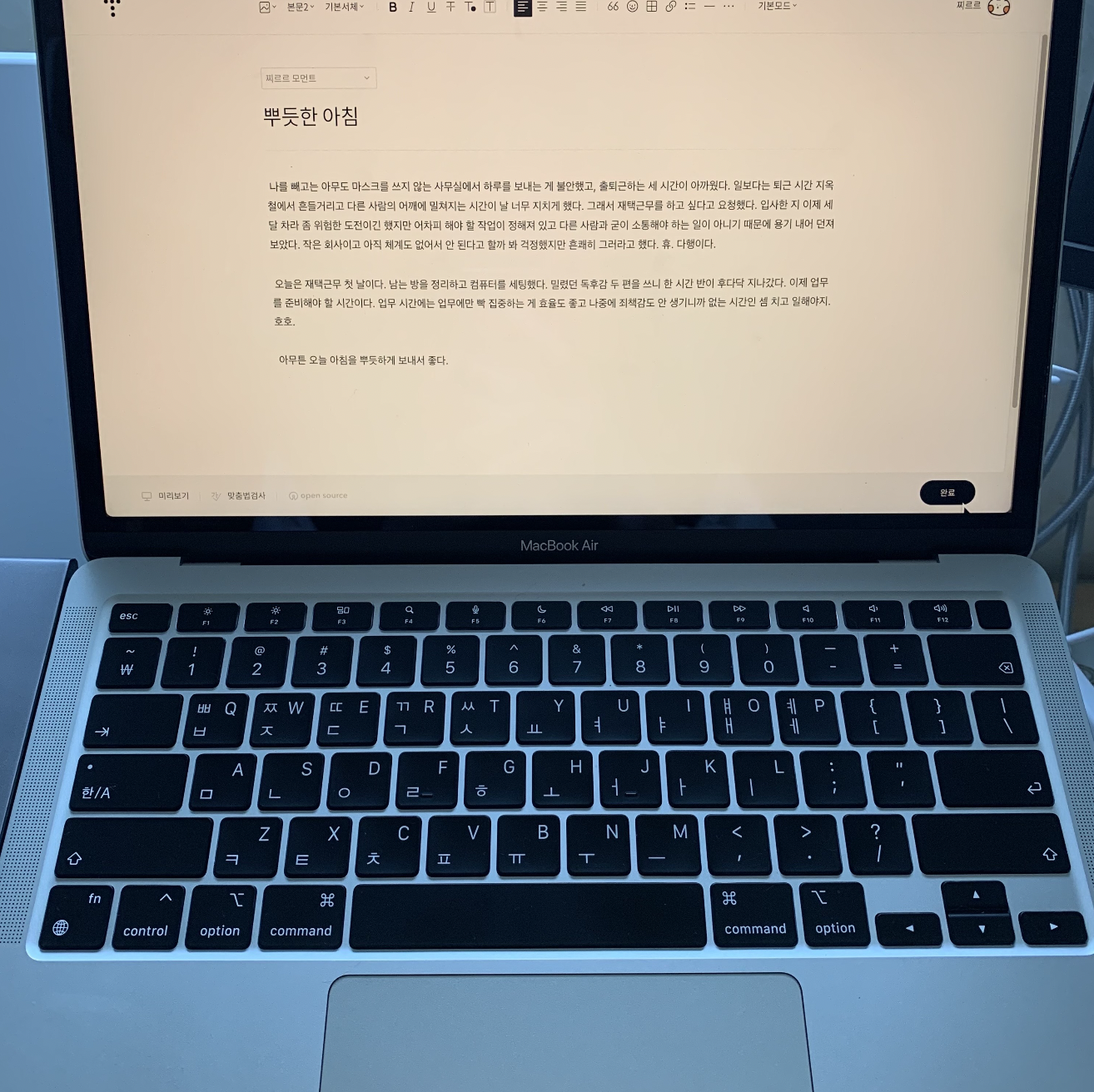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보 과다라고 할까 짐이 너무 많다고 할까, 주어진 세세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자기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런 콘텐츠들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때로는 엔진의 작동 정지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 어떻게도 뛰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 필요 없는 콘텐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정보 계통을 깨끗하게 해 두면 머릿속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지, 혹은 전혀 불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별해나가면 되는가.
이것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매우 단순한 얘기지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즐거운가'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뭔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자연 발생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걸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즐거움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부품,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깨끗이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어떻든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할 일은 재빠른 결론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적해나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원재료를 많이 저장해둘 '여지'를 자기 자신 속에 마련해둘 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대한 있는 그대로'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그대로 기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억 용량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의 프로세스=정보처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기꺼이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은 어떤 사실의(어떤 인물의, 어떤 사상의) 흥미로운 몇 가지 세부입니다. 전체를 통재로, 그대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라고 할까, 기억해봤자 분명 금세 잊어버릴 테니까) 그곳에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몇 가지 추출해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기 쉬운 형태로 머릿속에 보관해두도록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입니다.
/
뭔가를 쓰고 싶다는 표현 의욕은 없지 않은데 이거다 싶은 실속있는 재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물아홉 살이 되기까지 소설을 쓴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글로 써낼 만한 재료도 없는 데도 재료가 없는 그 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나갈 만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소설이란 단지 읽을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상당히 많이 읽었지만 내가 그걸 쓰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써야 할 것'이 줄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건 뭐 'E. T.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쪽 창고를 열고 거기에 우선 있는 것을-뭔가 좀 시원찮은 잡동사니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아무튼 쓸어 모으고 그다음에는 분발해서 짜잔 하고 매직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혹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방도가 없어요. 아무튼 있는 대로 죄다 쓸어 모아 그걸로 노력해볼 만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걸 해낸다면 당신은 큰 가능성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매직을 구사할 수 있다는 멋진 사실입니다(맞아요, 당신이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건 당신이 다른 혹성에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쓰려고 했을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쓸 게 없다는 것을 쓰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통감했습니다. '아무것도 쓸 게 없다'는 점을 거꾸로 무기로 삼아서 그 지점에서부터 소설을 써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앞선 세대의 작가들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진 것을 죄다 쓸어 모아 얘기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
그리고 대개 이때쯤에 한 차례 긴 휴식을 취합니다. 가능하면 보름에서 한 달쯤 작품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혹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이에 여행을 하거나 번역 일을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장편소설을 쓸 때는 일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내가 학교에 바라는 것은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의 상상력을 압살하지 말아 달라'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
그처럼 나는 새로운 소설을 쓸 때마다 '좋아, 이번에는 이런 것에 도전해보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대부분은 기술적인, 눈에 보이는 목표-를 한두 가지씩 설정했습니다. 나는 그런 식의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과제를 달성하고 지금까지 못 해본 것을 해내면서 나 자신이 조금씩 작가로서 성장한다는 구체적인 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따금 독자에게서 아주 재미있는 편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시간을 읽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이 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책은 꼭 살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편지입니다. 솔직히 말하겠는데, 나는 이런 독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틀림없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다음 책'을 제대로 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그녀의 마음의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민심을 현혹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술렁술렁 들떠서 입만 벌렸다 하면 돈 얘기입니다. 차분히 자리를 잡고 시간을 들여 장편소설을 쓸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가는 나까지 자칫 망가져버릴 것 같다-그런 기분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좀 더 팽팽하게 긴장된 환경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싶다. 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을 떠나 외국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
하나의 포지션, 하나의 장소(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장소)에 안주해서는 창작 의욕의 신선도는 감퇴하고 이윽고 상실됩니다.
/
그런데 어쩌다 소설을 쓰기 위한 자질을 마침 약간 갖고 있었고, 행운의 덕도 있었고, 또한 약간 고집스러운(좋게 말하면 일관된) 성품 덕도 있어서 삼십오 년여를 이렇게 직업적인 소설가로서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직도 나를 놀라게 한다. 매우 크게 놀란다.